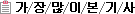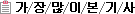| ▲ 박서운 울산과학대 명예교수 © 울산광역매일 |
|
지난 7월 동아프리카를 한 달여 다녀왔다. 남반구여서 겨울인 까닭에 쌀쌀하고 때로는 춥기까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프리카는 언제나 동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은 멀고, 덥고, 더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곤 했다. 마치 세상의 끝처럼 생각했던 아프리카! 강렬한 색상들과 원시적 춤사위, 그리고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아프리카의 전부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행이 끝난 지금 그 땅은 나에게 정답게 말을 건네 온다. 여행은 항상 우리의 오만과 자만 그리고 무지를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아프리카는 살만한 땅이었고 가난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
사하라사막 이북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보다는 역사나 지리적으로 유럽에 가까운 나라이고, 그 이남의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다. 자를 대고 그은 듯, 일직선으로 구획된 국경선은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과 침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종족간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은 지금의 아프리카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서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혹처럼 튀어나온 지역이 위로부터 후추해안, 곡물해안, 상아해안, 황금해안, 노예해안이라 이름이 붙어있다. 서구열강의 수탈과 약탈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땅이 스텝이나 사바나기후여서 건조하고 척박하여 농사가 쉽지 않다. 만성적인 물 부족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은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서 모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유럽인들이 일찍부터 휴가지로 많이 찾는 탓에 관광이 주된 산업이 되어서인지 이들은 외지인들을 무척이나 정중하게 대해준다. 피부색만큼이나 언행이 거칠 것으로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천성이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었음은 여행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단박에 알아챘다. 단지 그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이르지 못할 뿐이지 그들의 천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눈빛은 순수하고 또 영리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갈 아프리카를 기대해볼 만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질리도록 볼 수 있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의 광고판을 거의 볼 수 없어 신기할 정도였다.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차, 특히 도요타 자동차로 도배되어 있고 한 달 여 동안 현대차는 거의 몇 대 밖에는 보지를 못했다. 아프리카 관광의 백미는 아무래도 세렝게티와 같은 평원의 `사파리`이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6인승 사파리차량은 100% 도요타 차량이다. 그 넓은 `세렝게티` 평원은 비포장 길이고, 거기에다 길바닥은 마치 빨래판 같이 울퉁불퉁하여 차가 상하좌우 요동치며 미친 듯이 달린다. 어지간한 차량은 한 달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악조건이다. 이런 조건에 견딜만한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기술력일 것이다. 20여 년 전 독일 아우토반에서 봉고차만한 독일 승합차를 평균 시속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전할 때 조금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아직은 아프리카의 차량구매력이 떨어지고 이곳이 아니라도 수출할 곳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수출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로 눈 돌릴 때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프리카는 장엄하다. 세렝게티 대평원에서 뛰노는 수많은 야생동물, 빅토리아 폭포의 위엄, 나미비아 사막의 신비 그리고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 등 마지막 남은 인류의 보석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한밤의 추위처럼 우리는 아직도 아프리카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경제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함을 주장해본다. |